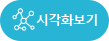| 항목 ID | GC05701866 |
|---|---|
| 한자 | 土幕-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집필자 | 송석기 |
[정의]
전라북도 군산 지역의 산비탈에 형성되었던 일제 강점기 도시 빈민의 움막집.
[개설]
토막집은 일제 강점기 동안 고율의 소작료를 견디다 못해 농촌에서 군산으로 몰려들었던 한국인들이 둔율동, 월명동, 개복동, 창성동 등 구릉 지역에 모여 살며 형성하였던 초가집 형태의 주거이다. 일본인의 주거지에 비해 도시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거 조건은 매우 열악하였다.
[일제 강점기 토막민 형성]
일제 강점기 동안 소작료가 너무 높아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민들은 오랫동안 터를 잡아 온 고향과 땅을 버리고 무작정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도시에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세가 치솟았고, 집이 없는 도시 빈민들은 움막이나 움집을 만들어 산비탈에서 모여 살았다.
서울의 경우 상경한 농민들은 경성 시내 변두리나 청계천 일대에 움막 같은 허름한 집을 짓고 사는 토막민이 되어 그 처절한 삶을 이어나가야 했다. 이들은 인력거꾼, 지게꾼 등으로 행세하며 고단한 일상을 버터 나갔다.
토막촌으로 유명했던 곳은 동부의 숭인동, 창신동, 신당리 일대와 마포의 도화동과 용산 청파동 일대였다. 신당리의 토막촌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 불어 닥친 문화 주택 열기로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며 세간의 화제를 뿌린 바 있다.
[군산 지역의 토막집]
군산에서 도시 빈민으로 살았던 한국인들은 둔율동, 월명동, 개복동, 창성동의 산비탈에 ‘토막’ 이라는 이름의 움막 형태의 흙집을 짓고 모여 살았다. 당시 남자들은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여자들은 일본인 집에서 식모살이와 미선공을 하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하였다. 1934년 9월 30일 조사된 한 통계에 의하면, 군산의 토막집 거주자는 경성에 이어 2위였고, 인구 대비 전국에서 1위이었다고 한다.
- 『군산 시사』(군산 시사 편찬 위원회, 2000)